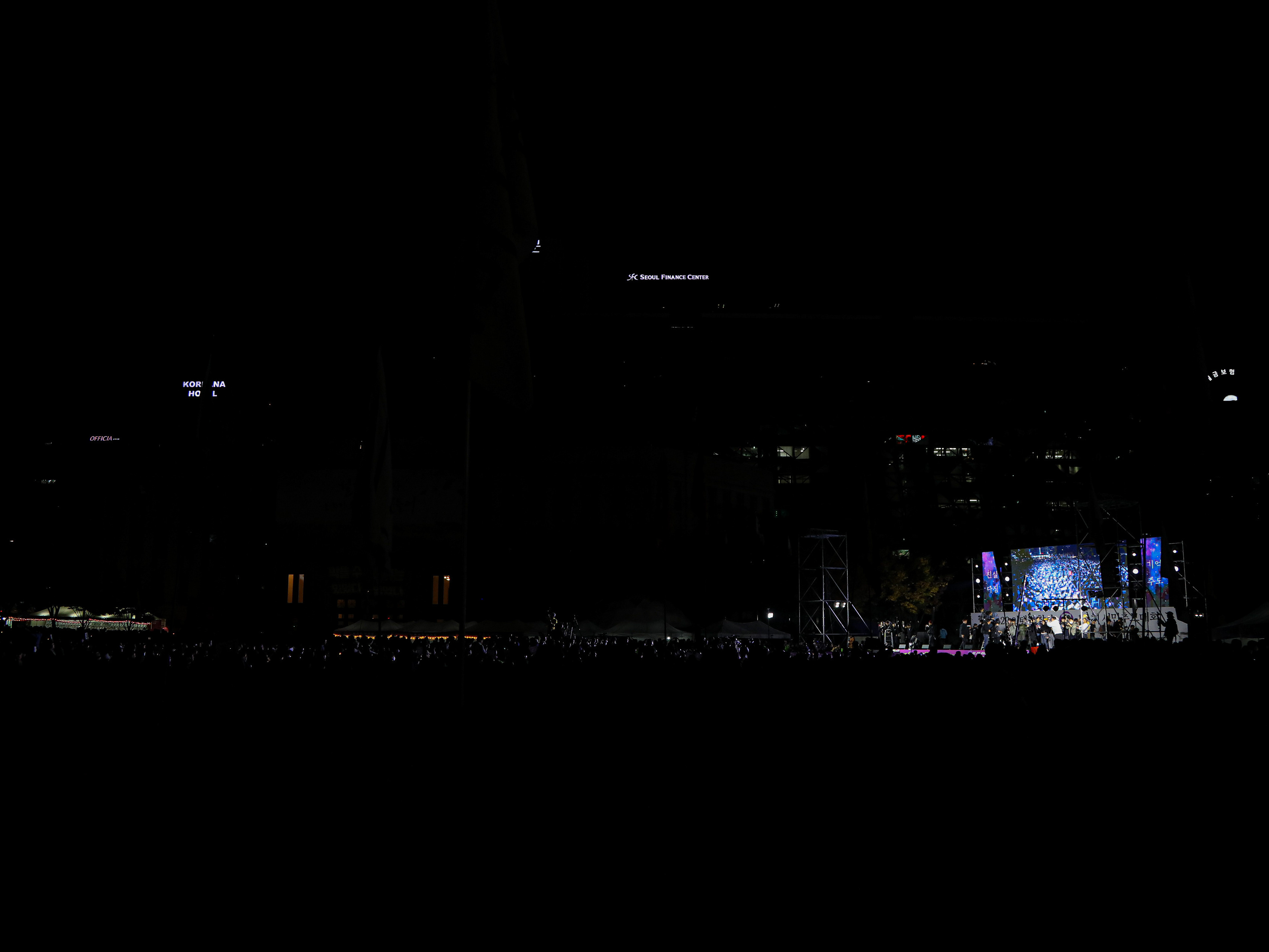규식을 만난 건 내가 장애 인권 운동 일을 하면서부터였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그는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선 경찰의 포위선을 손쉽게 뚫고 다녔다. 규식은 무서운 게 없어 보였다. 나는 가끔 그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규식은 늘 싸우는 모습이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규식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의 과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0대를 온전히 보냈다는 것. 시설을 나온 이듬해, 혜화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다는 것. 규식은 사고 이후 싸우는 사람이 됐고 현장에서의 규식은 소위 강성 활동가이자 싸움꾼의 이미지가 강했다.
규식과의 교류가 뜸해진 건 약 3년 후, 내가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서였다. 사석에서 한두 번 만나 밥을 먹거나, 현장에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얼굴을 보는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규식의 갑작스런 제안으로 나는 그의 일상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되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한 시간을 보냈다.
근거리에서 본 규식은 내 예상과 다른 점이 많았다. 생각보다 더 무뚝뚝했고, 조용히 다정하기도 했다. 규식은 이제 투쟁하는 게 질리고 싫다고 했다. 싸움꾼이던 규식이 싸움을 회피하는 일도 많았다. 아픈 곳이 많아져 매일 병원 1~2곳에 가는 게 하루 일과였다.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규식의 모습도 있었지만, 여전한 모습들과 새롭게 알게 된 모습도 많았다. 그는 무언갈 만드는 것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휠체어나 집에 있는 가구를 자신의 몸에 맞춰 새롭게 만든다. 규식은 자서전을 쓰기도 했고, 나에게 자신의 사진집을 만들어 달라며 채근하기도 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늙은 부모와 여행을 가고, 반려견과 소소한 일상을 보낸다.
나는 시간과 관계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규식의 모습을 찍고 싶었다. 활동을 하던 시절 카메라를 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오고 갔지만, 장애 당사자인 규식과 동료들을 찍은 사진은 늘 비슷했다. 호소하거나 울부짖거나 고개를 숙인 사람들의 모습. 장소나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이미지는 다르지 않았다. 하나의 고정된 시선으로 규식을 바라보았던 것은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쌓이며 다른 모습의 규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규식은 자신을 투모사라고 부른다. 투쟁 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본 규식은 투쟁 이외에도 꿈이 많은 사람이다. 요즘 규식은 은퇴 이후의 삶을 꿈꾼다. 제주에 가서 살고 싶다고, 아직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다.
그럼에도 규식은 여전히 거리에 있다. 사실 투쟁 없는 규식의 삶은 상상이 가지 않는다. 평범함을 얻기 위해 규식은 늘 싸워왔다. 규식의 나머지 삶도 왠지 싸우는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규식은 또 다른 무언갈 만들어갈 테다.